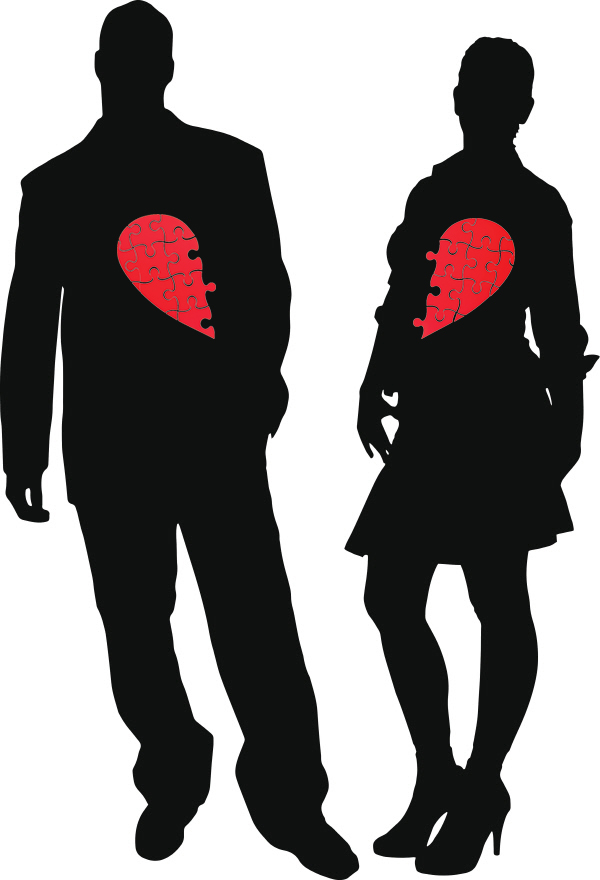|
브릿지경제 허미선 기자=“이 나이에 혼자 살다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텃밭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면 잡생각이 싹 사라지죠. 무념무상이랄지…상추 한 움큼을 뜯어도 기분이 진짜 좋아요.”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장숙자(70)씨는 혼자 소비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마트 패키지 때문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배신하지 않고 정성을 쏟은 대로 수확물이 영글어 주니 자식처럼 돌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이 동반한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마트나 시장 꾸러미 때문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보다도 많아진 수확물에 이웃에게 나눠주는 기쁨까지 누리고 있다.
이에 단독 주택 담장 밑 두평 남짓이었던 텃밭은 이제 꽤 다양한 종류의 꽃과 야채, 과실수들로 들어찼다.
봄이면 알록달록 철쭉과 탐스러운 함박꽃, 아롱이다롱이 야생화가 피고 집안 가득 재스민 향기가 진동한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다육식물들은 틈날 때마다 전혀 다른 색과 모양의 꽃을 피워대고 여름이면 치자 꽃내음이 장마를 알린다.
추석엔 텃밭 한 귀퉁이에서 캔 토란으로 탕을 끓이고 치커리를 말려 차로 마신다. 겨울 동백꽃과 포인세티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드나들며 친구들이 생겼고 수확한 야채를 나눠주고 화초를 분양하며 삶의 희열을 느끼곤 한다.
◇대견하고 애틋한 ‘아이들’, 자식들 키우려 다시 직장으로!
 |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찬수씨 사무실에서 자라고 있는 모종들,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고 있는 송찬수씨, 모종.(사진제공=송찬수) |
“아무 것도 안하고 드러누워 있기만 해도 포근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적 사고를 하게 되죠.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곤은 주말이면 텃밭에 가서 흙 파고 삽질하면서 풀어요. 남자들끼리 술 먹고 노느니 땀 흘리는 게 훨씬 좋죠.”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송찬수(34)씨는 잉여시간을 할애할 새로운 취미생활과 땅에 대한 막연한 선망으로 3월부터 주말농장에 텃밭을 꾸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다 똑같아 보이는 떡잎을 “이건 샐러리, 딸기, 페퍼민트…요건 가지”라며 단박에 알아보고 이름을 줄줄 외더니 강낭콩을 첫째, 둘째, 셋째란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새끼 같아요. 이게 잘 자랄까 싶었는데…완전 황무지였던 땅에 이랑을 내고 모종을 심고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진짜 자식 같다니까요.”
일하다가도 시시때때로 궁금해지니 어린 자식을 떼놓고 출근한 워킹맘 마냥 애틋함까지 느껴진다. 사무실의 빈 공간은 틈나는 대로 보살피는 모종들이 채우고 있고 텃밭에 가기 전날 밤은 설레 잠도 제대로 못잘 지경이다.
 |
| 송찬수씨의 자식과도 같은 애틋한 감자꽃, 선물로 깔끔하게 다듬고 씻은 샐러리, 이제 막 익기 시작한 딸기(위부터 시계방향).(사진제공=송찬수) |
“사실 지난해에 회사를 그만 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는데…막상 제 자식 같은 애들을 돈 받고 어딘가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 재입사했죠.”
텃밭 가꾸기 취미를 계속하기 위해 복직한 그는 수확한 야채들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한다. 정갈하게 다듬고 씻어 곱게 포장한 그의 정성에 지인들은 감동하기 일쑤다. 한 사무실 동료는 그가 건넨 샐러리 다발을 하루 종일 식사 대용, 간식 대용으로 먹어 치웠을 정도다.
“버릴까 봐요. 유기농이다 보니 벌레 먹기도 하고 그런데 못 먹는 거라고 버릴까봐…. 집에서 별로 밥도 잘 안해 먹었는데 텃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먹게 돼요. 이전에 마트에서 산 건 그냥 썩혀 버려도 아깝지 않더니 제가 수확한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남기려고 열심히 해먹죠.”
연애할 생각마저 잊은 그에게 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눈이 높은데 텃밭에 같이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며 타박이지만 그 마저 애정이 넘치니 그의 인간관계는 보다 깊어졌다.
◇초보 셰프의 알뜰한 식재료와 뜻밖의 운치를 선사한 대나무 숲
 |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양주 자전거길 앞에 조성된 텃밭 풍경, 토마토를 솎고 있는 초보셰프 김성규씨, 데이지, 꽃화분, 바질.(사진=허미선 기자) |
“늘 관심이 있었는데 못하다가 땅이 생기면서 실천에 옮겼죠.”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경기도 남양주에 수제햄버거 트레일러를 오픈한 초보 셰프 김성규(45)씨는 최근 자투리땅에 텃밭을 만들었다.
토마토 20그루와 바질, 이탈리안 파슬리, 쌈채소 그리고 데이지를 심었다. 햄버거 소스에 쓸 바질과 이탈리안 파슬리는 구하기도 힘든 데다 가격도 비싸 늘 애를 먹던 식재료였다. 게다가 아무리 단골이어도 매번 싱싱한 야채를 공급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생활 자체가 남의 잣대에 나를 맞춰야 하고 에너지를 얻기 보다는 빼앗기고 소진되잖아요. 그러곤 집에 와서 혼자 있자면 우주에 나 혼자라는 느낌에 너무 외로웠죠.”
요리를 배워 남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텃밭을 가꾸면서 곤충이며 벌레들도 친구가 되고 보살펴야하는 식물들에 외로움은 느낄 여유조차 없어져 버렸다.
“농사 짓기 전에는 그냥 상품의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식재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한번 심어두고 물만 잘 주면 쑥쑥 자라주니 이제 좀 난이도 있는 것들에 도전해볼까 싶기도 해요. 지인 중에 담배 농사를 지어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1년을 보내는 이들도 있죠.”
서울 연희동에 거주 중인 박채령(45)씨는 방 창문 앞에 대나무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키우려고 키운 건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날아왔는지 가느다란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무성해져 버렸죠.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금방 자라나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생긴 대나무 숲에 그는 눈이 소복하게 쌓인 설죽과 댓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로 사시사철 운치를 만끽 중이다. 볕이 좋을 때는 지인들을 초대해 대나무 숲 테이블에서 브런치를 즐기기도 하니 이 보다 더 좋은 ‘힐링’이 없다.
글·사진=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